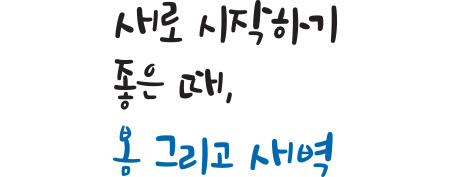본문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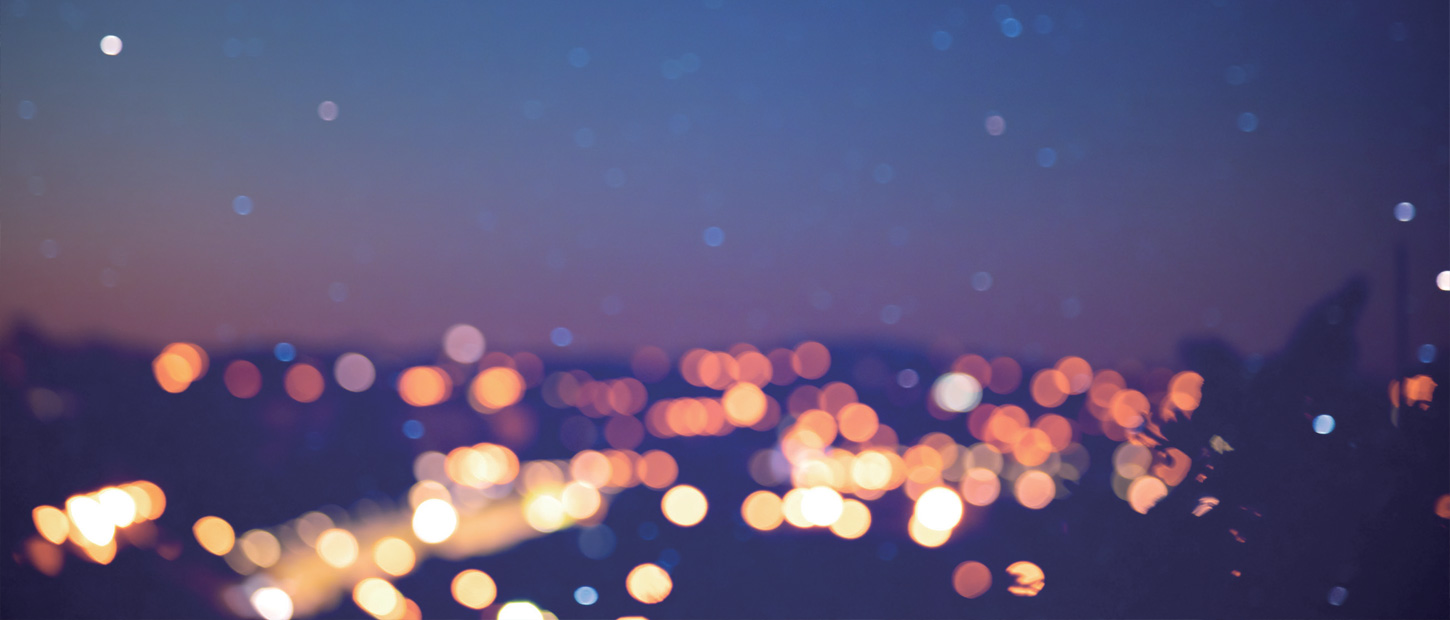
글. 대치남지점 이웅기 계장
지난 주말, 햇살과 바람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이제는 옷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졌고 이에 맞춰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인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반쪽짜리 봄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봄은 늘 설레는 계절이다. 포근한 날씨나 피어난 꽃 때문일까? 혹은 ‘입학’이나 ‘개강’처럼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던 단어들이 모두 3월에 해당하기 때문일까?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는 3월이 더욱 어울리고 또 익숙한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직을 하며,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다양한 ‘부캐’로 생활하게 되었다. 출근을 하면 ‘막내 계장’이라는 계정에 접속하고 그럼에도 고객님 앞에서는 ‘그럴듯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로그인하곤 한다. 작년부터는 ‘남편’이라는 계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가끔은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부캐’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나’라는 ‘본캐’를 잊은 채 잠자리로 향하곤 했다. 한 살 더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많은 역할과 의무 속에서 진짜 ‘나’라는 본캐에는 점점 더 소홀해져만 가는 기분이다. 그럴수록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뒤로 밀리게 된다.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은 무겁고, 마음만 조급한 그런 날들이 계속됐다. 뭔가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은 나를 자꾸 재촉하기만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졌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봄바람이 문을 두드리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새벽 있는 삶’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여느 아침형 인간처럼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경지에는 닿지 못했지만 5시 40분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어 이를 닦고, 명상이란 이름의 멍을 때린다. 족히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러나오기 충분한 시간이다. 애매하게도 5시 40분인 이유는 나에게 10분의 늑장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남으면 설거지나 빨래 정리처럼 밀렸던 집안일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읽고 싶었던 책도 2권 읽었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다시 잠들어버린 날도 있다. 하지만, 새벽이 나에게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의 김유진 변호사님처럼 책을 쓰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성과 있는 일을 해내지는 못하고, <미라클 모닝>의 할 엘로드의 말처럼 특별한 습관들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영업점에서 누구보다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기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피곤하다는 핑계가 겸연쩍지만, 내가 주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늘어난 시간은 1시간이지만 물리적인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고자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하나씩 해내다 보면 봄처럼 새벽도 설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