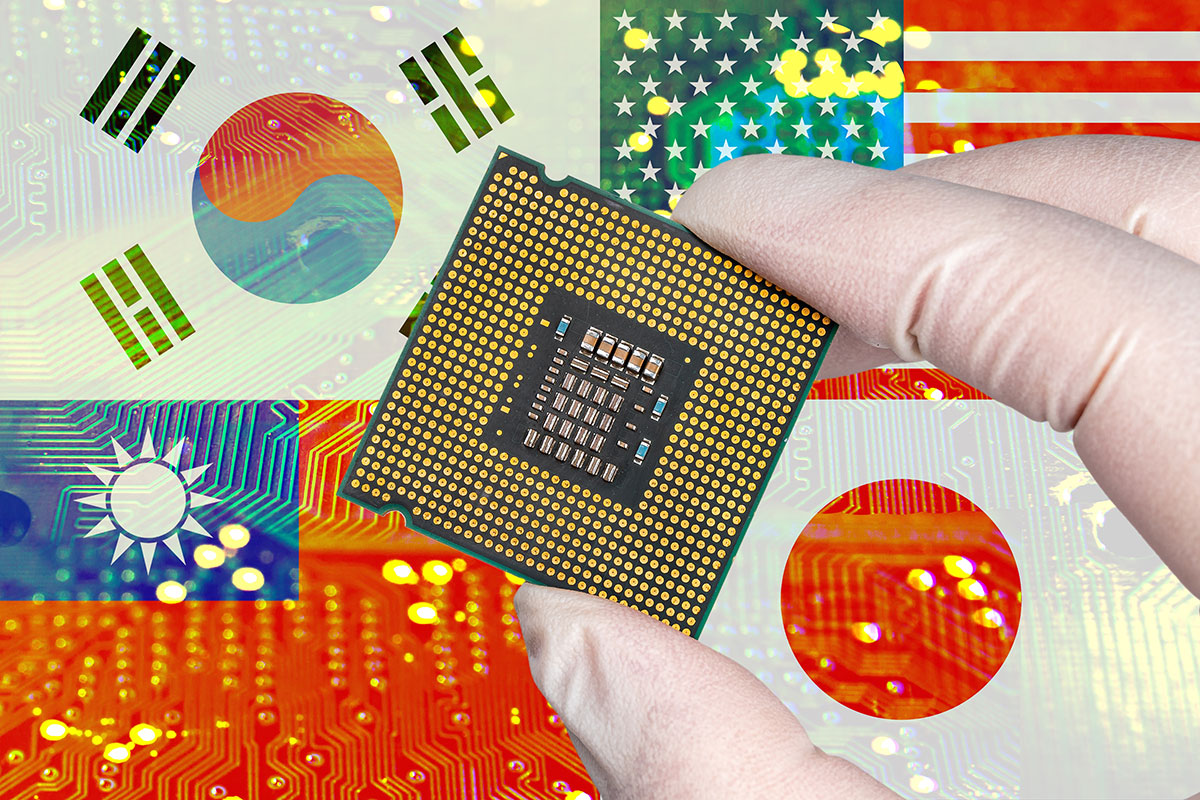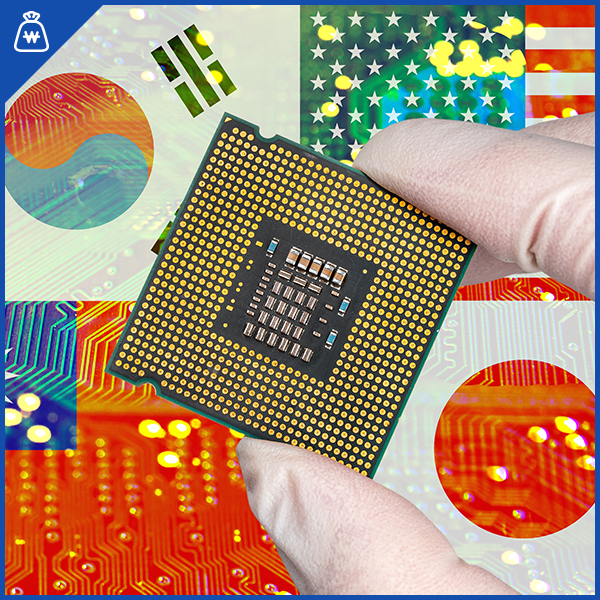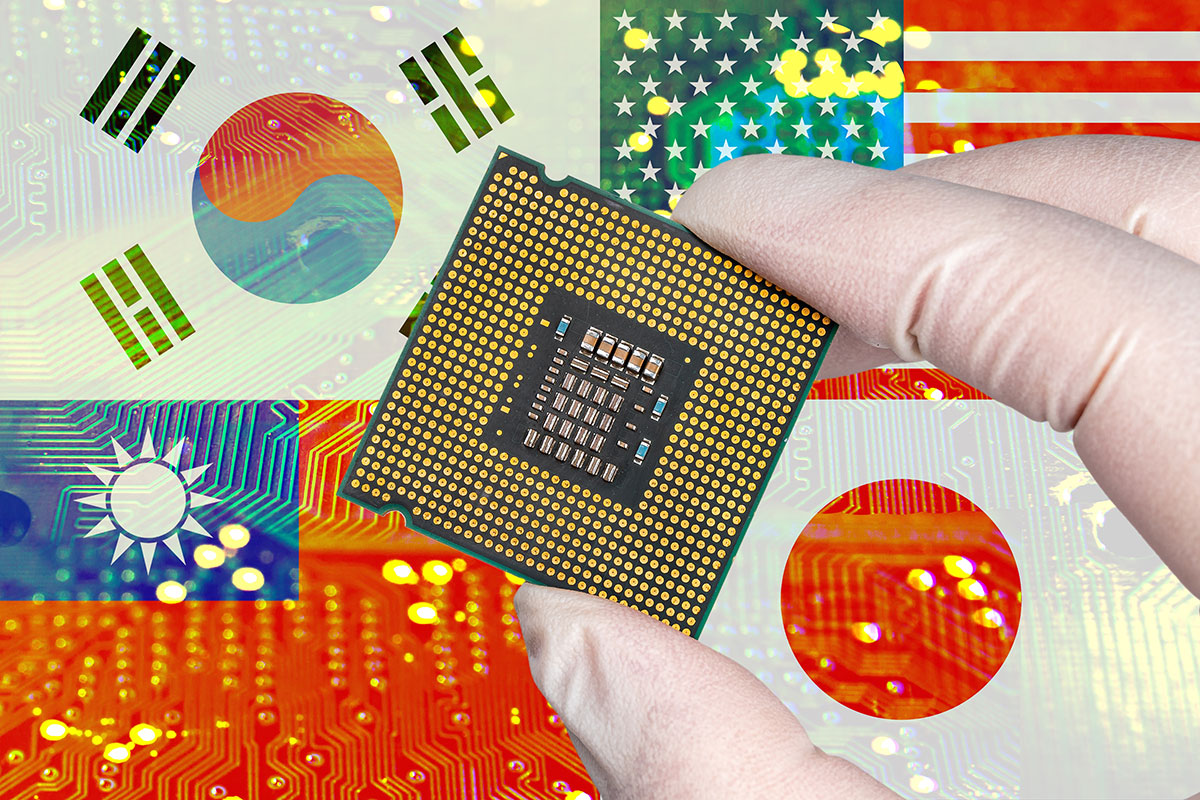그 어떤 나라도 나 홀로 모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이어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포장)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반도체란 것은 최고의 기술력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명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돼 움직였다. 가령 미국은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책임졌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왔다. 복잡한 반도체 설계도를 현실화시키는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 생산)는 대만의 몫이었고, 일본은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와 부품을 공급해왔다. 이렇게 전 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속에 저마다의 기술력을 발전시켜왔고, 자신만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이제 이 ‘반도체 생태계’는 끝났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표명하면서 ‘반도체 칩 4동맹’을 구현하러 하기 때문이다. 칩4 동맹, 한국 반도체 산업엔 득일까, 아니면 위험일까.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을 누르려는 것
현재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면 한국 21%, 대만 22%이고 미국은 12%, 일본 15%다. 그렇다. 이 4개 나라가 곧 반도체이다. 칩4(Chip4)는 네 나라가 협의체를 만들어 공급망도 관리하고 공동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서 바로 드는 의문.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잘 돌아가던 반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이 ‘칩4 동맹’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죽이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국가적 사업으로 내걸고 반도체에 올인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한식의 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와 있다. 그래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패러독스’ 처럼 중국이 추격하면 그만큼 한국은 더 앞서곤 했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무너지는 듯 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했다. 반도체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SMIC의 7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이다. ‘나노 공정’은 반도체의 회로 선폭을 의미한다. 이게 좁을수록 기술력이 높은 건데 보통 14나노 밑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기준선이 된다. 그런데 중국은 10나노를 뛰어넘어 바로 7나노까지 양산을 해버린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은 ‘기술유출’을 의심했다. 중국이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써 기술을 빼와 반도체를 키워왔다는 것. 여기서 생각해낸 것이 반도체 동맹이다. 어차피 세계 반도체시장은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이끌어가니까 이 4개 국가가 똘똘 뭉쳐 불법까지 사전에 막아 중국을 확실하게 눌러버리겠다는 포석이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칩4 동맹, 주가는 물음표
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칩4 동맹’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린 ‘딜레마’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는 건 득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중국은 ‘반도체 시장’을 갖고 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70%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일 정도다. 따라서 이 ‘칩4 동맹’으로 완벽하게 중국을 누르면 중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반항도 못한 채 항복하겠지만 변수도 있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도체 자생력을 키워갈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 시장 장악력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칩4 동맹’은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벌였던 우주개발 경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누가 먼저 우주 어디를 가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칩4 동맹’은 중국을 기술력으로 눌러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 중국이 시장을 갖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칩4 동맹’은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만 소비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보복도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이런 대립구도에 처했을 때 시간의 차이만 있었지만 결국 보복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반도체 패권에 들어가 당장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에선 내가 잘하는 걸 최대치로 끌어올려 잘하면 됐다. 그러면서 주가도 여기에 반응해 상승했다. 그렇지만 ‘칩4 동맹’이란 구도에 빠지면 한국 반도체산업도, 아니 대만도 일본도 팀워크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100이란 능력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 80만 써야 할 수도 있고, 나의 기술력을 팀원들과 공유도 해야 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한다. 이런 건 주식시장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공동체 의식’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재료이다. 이제 공은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렇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건 결국 기업의 몫이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