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여신관리부 윤규철 과장
남들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사는 게 고단하다고 느껴지는 날엔 이불 속에 파고들어 우주를 보곤 한다. 핸드폰 화면으로 저 멀리 우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세상이야 영혼 없이 감탄하면서.
은하계가 몇 개고 별이 몇 개고,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가도 도달하지 않는 그 어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우주의 크기에 압도되다 못해, 내 인생이 혹은 나라는 존재가 하찮고 작게 느껴진다. 종국에는 내가 하는 걱정들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세상만사 뭐가 됐든
우주의 신비보다 더 할 것이 있겠냐 싶어진달까?
하지만 내 위치가 가장이자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이다 보니 그걸로도 고단함이 가시지 않는 날이 꼭 있다. 우주고 뭐고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날.
그럴 때면 난 또 다른 우주를 본다. 멀리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집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하나만 열면 보이는, 깊은 밤 곤히 잠든 아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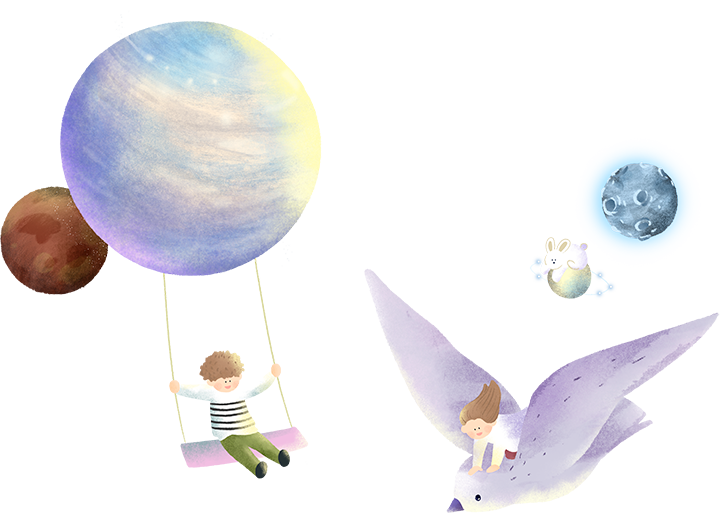
겉으로 보기엔 이 자그마한 존재들이 실은 어찌나 거대한지, 요 두 아이 앞에선 그 광활한 우주조차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다. 하늘거리는 머리칼이, 조그마한 콧구멍이, 내 손바닥만 한 발바닥이, 내게 있어서는 진정한
우주임을 깨닫게 된다. 해왕성에도 토성과 같은 고리가 있다는 사실보다 열 살 첫째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이야기가 더 재미나고, 타이탄에 어쩌면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보다 일곱 살 둘째가 약 3분가량의 긴 동요를
외웠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신기한 일이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꾹꾹 눌러쓴 글씨만 보아도 그렇다. 불과 몇 년 전엔 엄마 뱃속에서 점으로 있었을 작은 세포들이 지금은 각각 130cm와 110cm까지 자라나서 나와 같이 웃고 떠들고 때로는 나를
응원해 주는 편지를 써준다니. 이거야말로 과학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 아닌가? 끝도 없이 탄생하는 별들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고야 마는 나의 우주는 바로 두 딸인 것이다.
팔불출이라 해도 괜찮다. 딸바보라 불러도 인정한다. 그저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뻐근해진 고개를 돌리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떠올려 본다. 집에 가면 아빠! 하고 달려올 내 아이들에게, 나 또한 그만큼의
우주가 되어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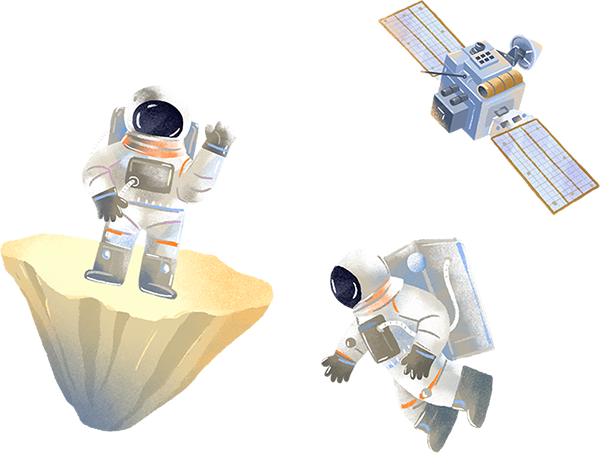
감동
오늘은 우리 애기 보러 빨리 퇴근해야겠어요.
wow
저도 마음한켠ㅇ ㅣ따듯해집니다. 잘 읽었어요
우와
맘이 따듯해지는 에세이에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아서 두 배로 더 기쁜 날입니다.
우주
아빠가 생각나는 밤이네요.. 아..아빠!!!!!!!!!!♥
Ah
아... 눈물 뚝 ㅠㅠㅠ 240센티가 뭘 말하는가 했는데. 이해하는 순간 뭉클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