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 않는다는 말
제15기 <우리가족> 편집위원 박영선 계장이 읽어주는 <지지 않는다는 말>
김연수 작가의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 소설, 에세이 내놓는 책마다 사랑을 받는 작가 김연수.
이 책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작가의 경험담이 담긴 책입니다.
‘매일 한 시간씩 달리다 보면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게 된다거나, 달리기는 자신이 속한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당장 내일부터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작가는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패배인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일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기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어’라고 작가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버텨서 이겨내는 삶을 권합니다. 바로 달리기처럼요!
글. 삼풍지점 박영선 계장 사진. 정우철


책 속의 문장 수집
휴식이란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쉴 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나를 둘러싼 반경 10미터 정도, 이게 내가 바로 사는 세계의 전부구나.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몇 명, 혹은 좋아하는 물건들 몇 개, 물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계가 그렇게 넓을 이유도, 또 할 일이 그렇게 많을 까닭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잘 쉰 셈이다.
인생의 일들은 언제나 짐작과는 다르다. 하물며 계획대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계획할 때의 우리는 ‘갑’의 입장이다. 스킨스쿠버도 배우고, 이탈리아에도 가고… 못 하겠다는 말은 게으름뱅이들의 사전에나 존재한다는 듯의 의욕에 차서 계획을 작성한다. 우리 인생에도 무자비한 사주가 있다면, 그건 계획을 세울 때의 ‘나’, 즉 ‘갑의 나’다. 그러나 막상 실천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을’의 처지가 되어 갖은 푸념을 다 늘어놓는다.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수천가지라도 더 댈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달리다 보면, 손가락만 까딱해도 되는 정도의 운동인데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온다. 정말이지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다. 어제가 그런 날이었다. 계획된 거리를 반 정도 달렸는데,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보통 때는 다 뛰고 난 뒤에도 천천히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제는 힘없이 걸어서 돌아갔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자책하는데, 뭔가 발끝에 차이더니 데굴데굴 굴러갔다. 주워 보니 밤톨이었다. 벌써 가을인 것이다. 그런데 밤이 뭐랄까 좀 다르게 생겼다. 묘사하자면, 음, 울퉁불퉁한 표면에 반쯤은 껍질 채 형성되지도 않았다. 위쪽에는 거친 표면 사이사이에 하얀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 밤을 손에 쥐고 돌아와 책상 위에 얹어 놓았다. 그냥 제대로 익지 않은 밤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름 내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나름대로 익었다고 생각해서 바닥에 떨어진 녀석인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 않았다기 보다는 제 방식대로 익었다고 말해야겠다. 그럼 이 녀석의 방식대로 익는 건 어떻게 익는 것일까? 밤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묘사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모두 나름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겠는가? 할 일 리스트에 빼곡하게 적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는 우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내 인생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쳐다보고 싶다.

휴식이란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쉴 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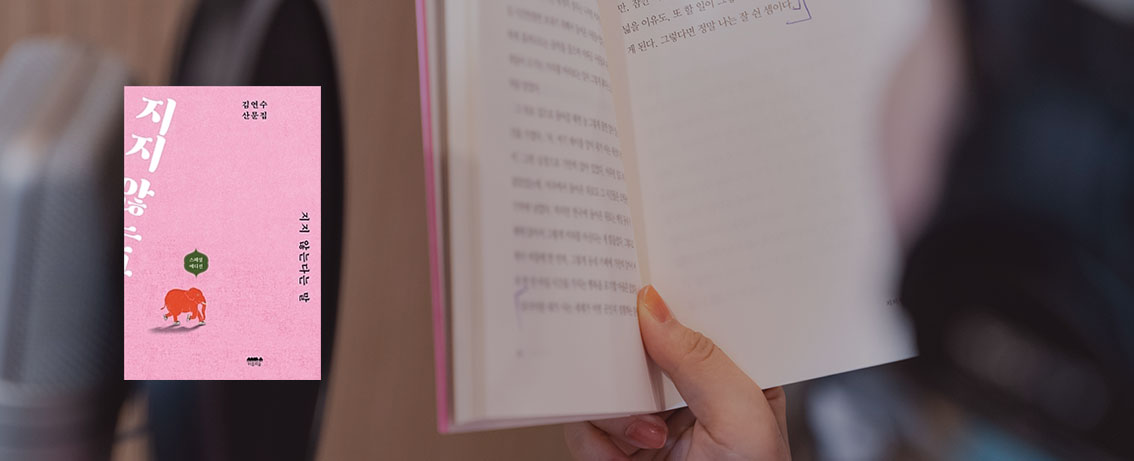

휴식이란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쉴 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