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림의 시간, 여행
글. 박준 시인
양양, 7번 국도
두 해 전 겨울 아버지와 함께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원하게 뚫린 해안도로를 달렸지만 바다를 보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소 보고 싶어 했던 한 부부 내외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으로 오가는 길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부부가 살고 있다는 작은 어촌 마을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어렵지 않게 그 분들의 집을 찾을 수 있었고요.
사실 그 집은 이십 년쯤 전에 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식당과 민박을 동시에 겸했던 곳. 당시 아버지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저녁이면 주인 내외 분과 밥을 먹고 밤이면 함께 바닷가로 나가 낚시도 하고 술잔도 기울였다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손님을 넘어 친구처럼 대해준 그 부부에게 아버지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십여년 만에 아버지를 본 그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이내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은 온화해졌고 이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고마웠다고 말을 하고 싶어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좋아한다는 위스키를 선물로 건넸을 때는 더 환해졌고요. 이십년 전에 고마웠던 일은 오늘도 고마운 것이지요.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이 언제라도 즐거운 것처럼.

제주, 1132번 일주도로
보기 좋게 실패한 여행도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겨울 바다가 펼쳐진 해안도로를 걸었던 기억. 마음속에서 자꾸만 뜨겁고 울컥한 것들이 터져 나오던 때의 일입니다.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장갑도 끼고 가방을 짧게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거센 바닷바람이 육지로 불어들었으니까요. 안경을 쓰고 있어도 눈을 뜨기 힘들었고 끊임없이 걷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으며 서 있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겨울 바다를 거닐며 이런저런 생각들에 잠겨야지, 바다를 보면서 크게 한숨 좀 쉬어야지, 그러다 백사장에 앉아 노래 몇 곡을 들어야지 했던 처음 제 계획은 산산이 어긋났습니다. 어서 큰길에 닿았으면 하는 마음. 그곳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겠다는 계획. 시내에 내려서는 무엇이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
한참을 더 걸은 뒤에야 저는 큰길에 닿았고 얼마 후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두 볼과 귀는 빨개졌고 입은 얼었고, 너무 거센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얼마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새도 없이.

부산, 경부선
무궁화호를 타고 처음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5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던 기억입니다. 늦은 밤 객차에서 몸과 생각을 뒤척이는 사이 기차는 저를 구포역에 내려주었습니다. 역사를 나가자 희뿌연 새벽하늘이 저를 반기고 있었고, 그 하늘 아래 24시간 영업을 하는 김밥집이 하나 있었고, 그 김밥집 앞에는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김밥을 먹었습니다. 오래 전 싸두었는지 적당히 굳어 있던 김밥, 그래서 더 밥알을 씹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다시 길을 걷다가 저는 그 유명한 해수욕장까지 걸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그곳은 이곳과 너무 멀어서 걸으면 한나절쯤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모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꽤나 가까워졌습니다. 2시간 16분이면 도착하는 고속열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산의 지리와 주요 관광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노포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도와 송도와 송정 너머 일광, 다대포와 청사포, 장산과 금정산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곳곳의 장소들이 제 머릿속에는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처음 보았던 구포역 앞, 24시간 김밥집과 함께.

어느 곳이든, 어떤 길이든
여행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로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낯선 풍경들이 펼쳐질 여행을 더 그립게 만드는 것이고 오랜만에 훌쩍 떠나는 시간을 더 반갑게 만들어줍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이든 바다든 섬이든. 생각처럼 즐거웠지만 생각하지 못한 외로움도 따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심한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나쁠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저는 떠나오기 전 머물던 일상의 장소들과 다소 버겁게 느껴지던 주변 사람들을 새로 그리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여행은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 흘려보낸 마음을 기다리기도 하고 결 고운 바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미 저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난 사람이나 이별 혹은 새로운 안녕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행,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 이 기다림을 온전히 다 기다리면 여정도 끝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여행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 떠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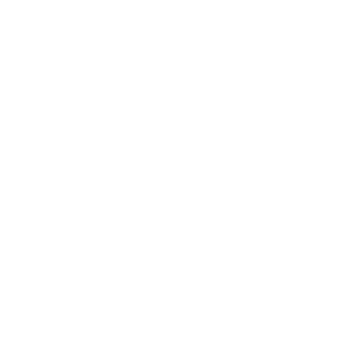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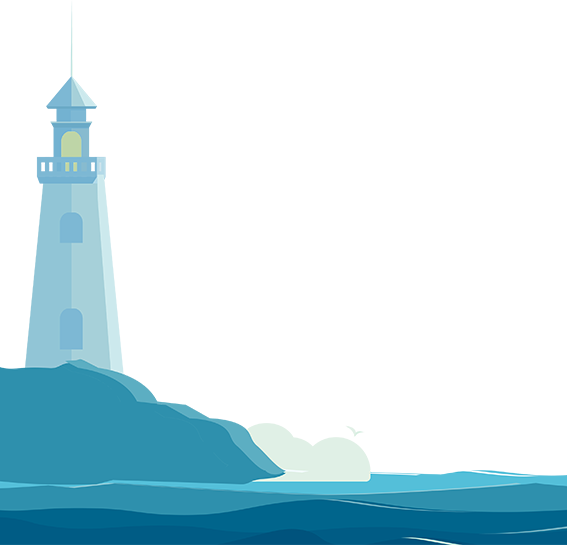
박준
시와 산문을 쓰는 작가다. 대표 저서로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등이 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