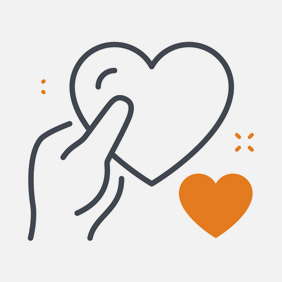어떤 가족 여행
글. 정이현(소설가) 일러스트. 오하이오

지리멸렬한 일상이 계속되던 몇 해 전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언젠가 해안도로를 지나다 본 적 있는 한 건물이 찍혀 있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자!”
“엥, 여기에?”
나는 그렇게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차 안에서 스치며 보았을 뿐인데도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외관을 가진 호텔이었다. 뭐랄까 몹시 웅장하고 장대한 위용을 자랑했으나 너무 웅장하고 장대한 나머지 현실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중국 무술영화의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응, 꼭 가고 싶어.”
그는 어쩐지 평소와 조금 달랐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현실적인 편이었다. 토요일 낮에 출발한다면 차가 많이 막힐 것이고, 그러면 서울에서 4시간은 족히 걸릴만한 거리였다. 그렇게 멀리 갔다가 다음날이면 돌아와야 한다니. 더구나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도무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바닷가 근처이기는 했지만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 내게 꽤 중요한 원고 마감일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다. 아무리 따져 봐도 갑작스레 짧은 여행을 떠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사실은 이미 예약했어.”
이럴 수가. 그가 예약했다는 방은 심지어 그 호텔에서 제일 넓은 룸이었다.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묵어갔던 곳인데 어쩐 일인지 요즘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인터넷을 뒤져 이용객들의 후기를 찾아보았다. 몇 개의 광고성 포스트를 제외하고는 호평을 찾기 어려웠다. 너무 오래 전에 지어져 모든 가구와 집기가 낡았다는 글이 많았고, 1980년대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듯 요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변도로 바로 앞인데 어떻게 방에서 바다가 안 보일 수 있는지 미스터리라는 후기를 읽었을 때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기차를 타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는 내 말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잘 모르는 길을 오랫동안 운전하고 싶어.”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였다. 그러고 보니 이즈음 그의 안색이 좀 어두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짐작 가는 바는 있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해버렸다.
“그럼 까짓 거, 가 보자.”
토요일 오후의 고속도로는 예상보다 훨씬 붐볐다. 4시간을 훌쩍 넘겨 해가 지기 직전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남편은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풀었으나 힘들다고 투덜댔다. 방은 정말로 넓었다. 너무도 광활하여 황량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용후기와 똑같이, 불현듯 1980년대 드라마 속으로 뛰어 들어와 버린 느낌이었다. 정말로 창문 너머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용후기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았다. 방 한가운데에서, 식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푸하하 웃음을 터트렸다.
여러모로 엉망진창인 여행이었다. 날씨는 너무 추웠고 해안가의 칼바람은 그야말로 매서웠다. 패딩점퍼를 목까지 채우고 목도리를 둘둘 말아도 바다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웠다. 근처에서 거의 유일한 맛집이라던 음식점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얼어 죽겠다고 소리치면서도 눈 쌓인 모래사장을 겅중겅중 뛰어다녔고, 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식당의 음식 맛은 제법 괜찮았다. 호텔 침대의 스프링이 꺼져있었는지 허리가 아파서 나는 너무 일찍 깨어났지만, 그 덕분에 오랫동안 마무리 하지 못하고 들고 다니던 책의 뒷부분을 뚝딱 다 읽을 수 있었다. 식구들은 해가 뜬 뒤에도 곯아떨어진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아침의 빛 속에서 나는 그들의 말간 얼굴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돌아오는 길은 더 한참 걸렸다. 다들 “와 진짜 너무하네.” “전 국민이 다 고속도로에 나와 있나봐.” 한 마디씩 꿍얼꿍얼했지만 “우리가 괜히 여길 왜 왔다 가는 거지”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으며, 그 이름이 어떤 잘못을 덮거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는 데에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그저 쓱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고 내밀한 집단.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정이현
소설가.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 <사랑의 기초-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중편소설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짧은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등을 출간했다. 이효석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