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게임을 하듯 요리랑 놀다
글. 박찬일 셰프

요리, 일이자 과학일 뿐?
“요리가 일이 되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죠. 돈을 받는 순간, 대가를 치러 드려야 합니다.” 종종 듣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서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다. 요리사에게 요리가 일이기만 하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어쩌면 요리란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과학의 영역이면서 당최 종잡을 수 없는 심리 영역인지 모른다. 마치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처럼.
‘料理(요리)’라는 한자가 원래 레시피란 뜻인데, ‘料’자는 쌀 미(米)와 말 두(斗)가 결합한 글자로, 말이라는 도구로 쌀을 잰다는 의미다. 정확한, 얄짤 없는, 아귀가 맞아야 한다는 의미. 쌀을 불리고 안치고 불을 세게 했다가 낮추고 뜸 들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밥이 안 된다. 빨리 밥을 지으려고 무슨 수를 동원해봤자 딱 그만큼 맛이 없어진다.
어떤 카레 잘하는 집을 가니 향료를 사오지 않고 직접 배합비를 맞춰 만드는데, 15가지인가 16가지 향료가 그램 단위로 써 있었다. 카레집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50인분이에요. 이걸 집에 가서 만드는 사람은 대개 실패해요. 5인분을 하거든요.” 무릎을 쳤다. 50인분에 강황 135그램, 큐민시드 48그램, 후추 14그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5인분으로 하면 13.5그램, 4.8그램… 해야 한다. 집에 소수점 아래 단위 저울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반올림 하거나 소수점 아래를 버린다.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요리는 팀워크의 맛
요리가 재미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따져봤다. 아닌 게 아니라 있다. 내 경우는 우선 팀워크의 맛이다. 축구팀이 있다고 하자. 골이 나오려면 ‘빌드업’이 필요하다. 상대의 공을 가로채서 연결하고, 압박을 피해 공격수에게 보내고, 그는 창의적으로 골을 넣는다. 이 과정이 요리에도 있다. 특히 직업 요리는 거의 팀워크로 결과를 낸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보자. 그날 준비한 아이템은 ‘꿀을 입혀 달게 구운 꽃상추와 신선한 로즈마리향의 계절 버섯볶음과 허브 소스의 채끝 스테이크’다. 주문이 들어온다. 굽는 이는 고기를 꺼내 양념을 하고 그릴에 얹는다. 그 타이밍에 셰프는 소스냄비를 낮은 불 위에 올린다. 알맞게 데워질 타이밍을 계산해서 더운 요리 라인의 요리사가 손질해둔 버섯을 소테하면서 로즈마리를 훅 뜯어서 뿌린다. 향이 순간 퍼져나간다. 셰프는 두어 시간 전에 미리 손질해서 데쳐둔 꽃상추에 꿀을 발라 시간을 가늠해서 오븐에 넣는다. 그 모든 요리가 셰프 앞에 착, 모인다. 정확한 타이밍에. 셰프는 딱 1분만 더 기다렸다가, 그릴에서 넘어온 채끝을 잘라서 접시에 담을 요량을 하고 있다. 과연, 고기는 정확하게 익었고 육즙의 손실도 없다. 차분하게 담는데, 접시가 너무도 알맞게 뜨거워져 있어서 손등에 살짝 화상을 입힌다. 이건 기분 좋은 신호인 것이다. 소스를 뿌리는데 농도가 아주 기막혀서 접시에 떨어질 때마다 퍼져 나가는 점도가 이상적이다.
요리, 바로 이 재미
요리사는 이런 재미로 산다. 거의 그렇다. 매상이 좋아서 기쁠 때도 있지만 팀워크가 척척 맞아떨어지는 조직이 더 신나게 만든다. 연봉이 적어도, 팀워크가 끝내줘서 우승하는 축구팀에서 뛰는 게 축구선수의 꿈일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돈이라고? 메시에게 물어보자. 좋은 패스 100개가 좋은지, 최고 연봉이 좋은지. 어쩌면 “연봉이요! 패스가 오지 않아도 하프라인부터 단독 드리블로 넣으면 되거든요”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요리는 즐겁다. 일로 하지 않으면, 일로 해도 즐겁다. 팀워크가 좋은 1++이고, 조미료고, 인생맛집이다. 여러분의 팀은 어떤가. 좋은 패스가 안 온다고? 단독 드리블은 곤란하다. 그건 손흥민이나 메시나 가능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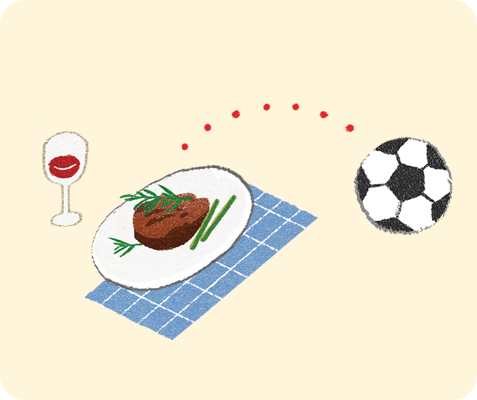
박찬일 요리연구가, 칼럼니스트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했다. 한식에도 관심을 가져서 국밥과 냉면도 만든다. <광화문 몽로> <광화문 국밥>의 셰프로 활동 중이다. 2020, 2021 미쉐린 코리아 <빕 그루망> 부문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노포의 장사법> 등 여러 권의 책도 썼다.

 이전글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