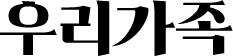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몸이 쉴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쉴 수 없기 때문이고, 마음이 쉴 수 없는 이유는 감정이 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감정의 휴식이 되어야 마음 전체, 몸 전체도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몸이 아플 때야 ‘강제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감정의 휴식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감정의 휴식이란 감정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기에 가깝다. 살아있는 한 감정 자체를 멈추기는 불가능하기에.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매일 느끼느라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이 없었기에, 나는 ‘소소한 기쁨’이라는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추천한다. 예컨대 너무 강렬하고 자극적인 흥미로움보다는 ‘소박한 재미’를 찾는 감정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자극적인 재미를 찾다 보면 마음이 쉴 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박한 재미는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해 준다. 작가 앤 라모트는 <작은 승리들 Small Victories>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몇 분만 플러그를 뽑으면 다시 작동한다. 당신도 그렇다(Almost everything will work again if you unplug it for a few minutes, including you).”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며 까르르 웃었다. 그 미소 자체가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휴식’이었다. 아름다운 문장들을 읽으며 ‘일에 중독된 내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소박한 재미이자 감정의 휴식이 되어준 것이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쉬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첫 번째 휴식의 단계, ‘천천히 흘러가기 연습’을 해보자. 서랍을 정리한다든지, 책상을 치우는 등의 간단한 청소를 시작해 보자. 집 전체를 치우는 대청소는 휴식이 될 수 없으므로, 아주 작은 범위의 청소를 천천히, 노는 것처럼 ‘사부작사부작’, 부담없이 시작해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메모해 놓고 잊어버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답장하기로 했던 편지들, 마음은 먹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장소들의 리스트들, ‘버킷리스트’에 꼽아 두었던 아름다운 여행지들 등등. 2시간 정도만 책상 서랍을 정돈해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의 리스트가 주르륵 나온다. 그 ‘머나먼 언젠가를 지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휴식임을 깨닫게 된다. 1박 2일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혼자 여행 다녀오기, 선베드나 벤치에 누워 그동안 미뤄 두었던 신간 소설이나 시집 읽어보기, 업무가 아닌 온전한 우정을 위한 손편지 써보기 등등. 이렇게 소박한 재미에 마음을 주다 보면 어느덧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벗어나 감정의 휴식을 시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휴식의 단계는 ‘기계를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휴식이기도 하다. 이것도 갑자기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SNS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이 문제라면, 가장 자주 쓰는 앱을 하루만이라도 지워보자. 앱은 자동 반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앱을 보는 순간 괜히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아무런 새로운 알림이 없어도 그저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에 낚여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부러움이나 질투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충동이나 질투가 감정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 반사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자. ‘앱을 향한 중독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앱을 지워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런 앱이나 휴대폰의 여러 기능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채로 상자나 서랍에 한 시간만 넣어두어 보자. 그럼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이 어렵다면, 일단 기계에 연결되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종이 위에 적어보자. 컴퓨터로 글을 쓰면 또 한 번 광고나 뉴스에 낚일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위에 손으로 직접 메모를 하는 습관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기계로부터의 쉼, 온라인으로부터의 휴식’을 하면 훨씬 더 맑고 명료해진 사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면, 종이 위에 소박하게 손글씨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창조성의 원천은 마음의 휴식과 여백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자고, 푹 쉬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듯이, 마음과 두뇌 또한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셋째, 관계로부터의 휴식을 실천해 보자. 골치 아픈 인간관계로부터의 휴식이야말로 최고의 쉼이다. 주변에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카카오톡을 쉰다든지, ‘뒷말’을 듣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는 용감하게 뛰쳐나오자. 스트레스를 부르는 관계를 쉬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잡다한 메시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뒷말을 들을 용기, 욕을 먹을 용기, 미움받아도 괜찮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알림’ 기능만 꺼도 그 수많은 달갑지 않은 메시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휴식은 단순한 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정신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테메노스(Temenos)’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테메노스란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처럼, 자아가 무의식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마음의 공간이다. 소란스러운 바깥 세상의 온갖 걱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나를 찾기 위한 정신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진정한 내면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소로는 <월든>에서 ‘온전한 삶의 정수’를 경험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소란으로부터 떠났음을 고백한다. 그가 숲으로 떠난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삶의 정수를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감정노동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곳. 과도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곳.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나의 현재’를 지켜내는 곳. 그런 마음의 공간이 바로 테메노스다. 오래 전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잠깐 머문 적이 있다. 책을 쓰기 위해 취재차 방문한 곳이었지만, 도시가 워낙 아름다워서 취재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행복한 여행처럼 느껴졌다. 그곳이 멋진 장소라는 이유로, 내가 정말 피곤하고 지쳤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오래된 호텔이었는데 아름다운 정원에 벤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나중에 시간 나면 꼭 저기 저 벤치에 앉아 있어야지’라는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그 벤치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비수기라 그런지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벤치에 드러누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것이다. 그때 처음 알았다. 벤치에 덩그러니 누워 하늘만 보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들의 지저귐이 그토록 선명하게 들린 것은 얼마만이었는지. 풀벌레들의 합창이 그토록 영롱하게 들린 것은 또 얼마만이었는지. 그렇게 고요한 휴식은 과연 몇 년만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쉬지 못했니, 왜 그렇게 일만 하려고 했니,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었니. 내 안의 또 다른 나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데미안>에 대한 대중 강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독자들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크로머(작품 속의 악당)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곤 했다. <데미안>에서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휘파람 소리’로 싱클레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휘파람소리가 들리면 바로 튀어나가 크로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크로머와 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의를 마치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무시무시한 크로머가 내 안에도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내 안의 크로머는 바로 ‘일중독’이라는 악당이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독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오랫동안 한 번도 쉬어볼 틈이 없었던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빌런’만이 진짜 악당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나, 계속 잘 해야만 한다고,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 무엇도 나를 멈출 수 없다며 나 자신을 괴롭히는 ‘내 안의 크로머’가 바로 일중독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저녁노을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밤이 깊어갈 때까지, 아름다운 정원 벤치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허리가 아파서 할 수 없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밤새도록 그곳에 있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렇듯 감정의 휴식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월든처럼 머나먼 자연 속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장소든 아름다운 테메노스, 즉 내면의 성소(聖所)가 될 수 있다. 내 방안의 작은 침대가 내면의 성소가 될 수 있고, 매일 쓰는 책상이 내면의 성소가 될 수도 있다. ‘이곳’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의 휴식이 이루어지는 소박하고 정갈한 장소를 만들어 가꾸자. 나만의 아름다운 휴식의 장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곳에서는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온전한 나’와의 만남을 가져보자. 감정의 차분한 휴식 속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테메노스를 경험해 보자. 당신 안에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눈부신 해방의 공간, 창조의 장소, 기쁨의 성소가 숨겨져 있다.